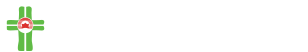23년도 교리교사의 날 공모전 산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고등부 김은지 안젤라 선생님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파일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별무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소한 일들은 흐릿해졌을지라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남아 있게 하는 힘 말이다.
아마 온기일 것이다. 기억 저편에 머무르는 온기. 내가 언젠가 느꼈던 그 따스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남아 있다. 그리하여 나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린 날에는 그 온기가 장작이 되어 더 큰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주일학교가 그런 존재였다.
나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성당을 열심히 다녔다. 복사단, 전례부, 율찬부, 성가대 등 안 해본 활동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모태 신앙이라는 환경에서 성당을 밥 먹듯 다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사를 드리는 일도, 미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교리를 듣는 일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고, 현재까지도 내가 성당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 내가 함께 성당을 다니던 친구와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자고 약속하게 된 것은 어쩌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직도 강당 앞에서 교리 교사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던 날이 생생하다. 지키지 못할 수많은 약속 중 하나가 될지라도, 언젠가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기만 할지라도 좋았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동안 받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하느님 안에서 충만했던 신앙심과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나누고 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날의 ‘약속’이 되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친구와 내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된 후, 나는 나의 중고등부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정확히는 그 당시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을 꺼내보았다. 나도 새롭게 만날 친구들에게 나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한 첫 행사였던 부활 행사에서 금세 깨달았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은 나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가 상상한 만큼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이들이 3명밖에 오지 않을 때도 다시금 뼛속까지 와닿고는 했다. 우리는 매주 5명을 넘지 않는 학생 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가며, 매달 계획해놓은 행사 기획안을 몇 번이고 수정하며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와 주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좌절하고 체념하기보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모여 기도했다. 사실 이때를 돌이켜보면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한 명 더 올 거라는 희망보다는 다른 교사들과 의지를 다지고, 서로의 신앙심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넓은 교사실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 쉽게 지칠 수도 있었을 시기를 더욱 큰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이 바로 내가 교리 교사로서 처음으로 느꼈던 ‘온기’, 즉 타인과의 유대이다.
끝내 우리의 진심이 닿아, 현재는 약 4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등록을 했다. 3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이 되고, 그 사이에 캠프까지 다녀오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다. 전례나 성가, 율찬까지 모두 교사들이 맡았던 시기를 보내고 나니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이나 어색함 같은 불필요한 감정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저 성당에 나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커서 막막해 보였던 산을 하나 넘으니, 발에 걸리는 돌부리나 작은 구덩이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아니게 된 것이다. 그래도 가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과 활짝 핀 꽃밭 같은 풍성한 기쁨이 있어 교사들은 다시 사랑 가득한 두 팔을 아이들에게 뻗을 수 있었다.
별무리. “별자리로 공인되지 않은 별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나는 이렇듯 정해진 자리 없이 모인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 이름이 별무리라면 우리 동료 교사들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저건 어떤 별자리라고 특정 지어 말할 수는 없어도 ‘별무리’라는 이름 하나로 한자리에 모인 각자의 삶들을 묶을 수 있다면 말이다.
한창 여름캠프 9일 기도를 하던 때, 8일 차에 모두의 마음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다. 바로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46)라는 구절이다. 그때 나는 교사들에게 우리 모두가 반짝이는 진주라고, 오늘 이 순간의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지금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불 꺼진 교리실에서 하늘거리는 촛불을 둘러싸고 모인 인연들이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기 쉽지 않다. 둘이라면 더욱 그렇고, 셋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교사 7명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자신이 성당에서 교리 교사로서 하는 일을 아끼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공동체를 아끼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여름캠프가 코앞으로 다가오던 날 우리는 그 감정을 서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같은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직까지도 9일 동안 촛불에 데워졌던 촛대만큼이나 뜨거웠던 우리의 ‘하나됨’을 느낀다.
언젠가는 분명 내가 더는 교사회에 속하지 않고, 지난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저 행복했다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교리 교사로서 겪었던 사소한 일들은 전부 흐려질지라도 기억 저편에 머무르는 온기, 별과 진주가 내뿜는 빛, 그 따스함만큼은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 오래도록 내 안에 살아 숨 쉴 것이다.
언젠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고 또 보고 싶겠지만, 내가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께 받은 온기로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만난 학생들 역시 나를 통한 온기로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란다. 아주 깊게,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아멘.
중고등부 김은지 안젤라 선생님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파일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별무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소한 일들은 흐릿해졌을지라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남아 있게 하는 힘 말이다.
아마 온기일 것이다. 기억 저편에 머무르는 온기. 내가 언젠가 느꼈던 그 따스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남아 있다. 그리하여 나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린 날에는 그 온기가 장작이 되어 더 큰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주일학교가 그런 존재였다.
나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성당을 열심히 다녔다. 복사단, 전례부, 율찬부, 성가대 등 안 해본 활동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모태 신앙이라는 환경에서 성당을 밥 먹듯 다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사를 드리는 일도, 미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교리를 듣는 일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고, 현재까지도 내가 성당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 내가 함께 성당을 다니던 친구와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자고 약속하게 된 것은 어쩌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직도 강당 앞에서 교리 교사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던 날이 생생하다. 지키지 못할 수많은 약속 중 하나가 될지라도, 언젠가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기만 할지라도 좋았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동안 받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하느님 안에서 충만했던 신앙심과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나누고 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날의 ‘약속’이 되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친구와 내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된 후, 나는 나의 중고등부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정확히는 그 당시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을 꺼내보았다. 나도 새롭게 만날 친구들에게 나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한 첫 행사였던 부활 행사에서 금세 깨달았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은 나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가 상상한 만큼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이들이 3명밖에 오지 않을 때도 다시금 뼛속까지 와닿고는 했다. 우리는 매주 5명을 넘지 않는 학생 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가며, 매달 계획해놓은 행사 기획안을 몇 번이고 수정하며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와 주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좌절하고 체념하기보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모여 기도했다. 사실 이때를 돌이켜보면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한 명 더 올 거라는 희망보다는 다른 교사들과 의지를 다지고, 서로의 신앙심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넓은 교사실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 쉽게 지칠 수도 있었을 시기를 더욱 큰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이 바로 내가 교리 교사로서 처음으로 느꼈던 ‘온기’, 즉 타인과의 유대이다.
끝내 우리의 진심이 닿아, 현재는 약 4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등록을 했다. 3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이 되고, 그 사이에 캠프까지 다녀오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다. 전례나 성가, 율찬까지 모두 교사들이 맡았던 시기를 보내고 나니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이나 어색함 같은 불필요한 감정들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저 성당에 나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커서 막막해 보였던 산을 하나 넘으니, 발에 걸리는 돌부리나 작은 구덩이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아니게 된 것이다. 그래도 가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과 활짝 핀 꽃밭 같은 풍성한 기쁨이 있어 교사들은 다시 사랑 가득한 두 팔을 아이들에게 뻗을 수 있었다.
별무리. “별자리로 공인되지 않은 별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나는 이렇듯 정해진 자리 없이 모인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 이름이 별무리라면 우리 동료 교사들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저건 어떤 별자리라고 특정 지어 말할 수는 없어도 ‘별무리’라는 이름 하나로 한자리에 모인 각자의 삶들을 묶을 수 있다면 말이다.
한창 여름캠프 9일 기도를 하던 때, 8일 차에 모두의 마음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다. 바로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46)라는 구절이다. 그때 나는 교사들에게 우리 모두가 반짝이는 진주라고, 오늘 이 순간의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지금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불 꺼진 교리실에서 하늘거리는 촛불을 둘러싸고 모인 인연들이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기 쉽지 않다. 둘이라면 더욱 그렇고, 셋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교사 7명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자신이 성당에서 교리 교사로서 하는 일을 아끼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공동체를 아끼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여름캠프가 코앞으로 다가오던 날 우리는 그 감정을 서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같은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직까지도 9일 동안 촛불에 데워졌던 촛대만큼이나 뜨거웠던 우리의 ‘하나됨’을 느낀다.
언젠가는 분명 내가 더는 교사회에 속하지 않고, 지난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저 행복했다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교리 교사로서 겪었던 사소한 일들은 전부 흐려질지라도 기억 저편에 머무르는 온기, 별과 진주가 내뿜는 빛, 그 따스함만큼은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 오래도록 내 안에 살아 숨 쉴 것이다.
언젠가 학생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고 또 보고 싶겠지만, 내가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께 받은 온기로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만난 학생들 역시 나를 통한 온기로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란다. 아주 깊게,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아멘.